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역함수의 그래프 및 교점 구하는 방법, y=x와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이해 (고1수학 함수)


안녕하세요? holymath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포스팅은 2015개정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개념을 보다 쉽고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는 글입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는 공식과 문제 푸는 요령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원리와 개념들 사이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교과서나 참고서에 있는 수학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전 포스팅까지 역함수의 개념 및 성질에 대해 공부를 해봤는데요. 역함수와 관련해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유형이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 본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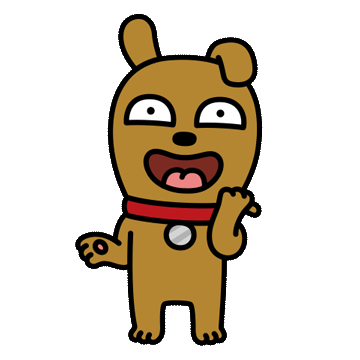
● 역함수의 그래프
함수
가 성립합니다. 이 말은 즉, 점
지난 포스팅에서 주어진 함수

이상으로부터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 ■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 |
| 함수 |

함수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
따라서
●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구하기
보통의 경우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함수
이차함수는 원래 일대일이 안 되기 때문에 역함수를 생각할 수 없지만, 이 문제처럼 정의역을 제한하여 일대일함수가 되도록 하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직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이때,
즉, 교점의 좌표는
따라서
● 역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x와의 관계 (심화)
위의 예제처럼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때 직선
| ■ 보충 정리 1) |
|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
위의 정리는 충분조건 기호(

즉,
위의 정리에서
중학교 때 배운 반비례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에요. 즉, 그래프 위의 모든 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 됩니다. 반면 직선
따라서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할 때 맹목적으로 직선

함수
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
이고
따라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위의 예제에서 만약,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 본 함수의 식과
그럼

즉, 위의 예제에서 방정식
그렇다면 이 방정식의 음수 해인

다행히도 실제 시험에서는 위의 예제와 같이 교점이 직선
다음 정리는 언제 이런 풀이를 마음 놓고 써먹어도 되는지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 ■ 보충 정리 2) |
|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
교육과정에 등장하지 않는 '순증가함수'라는 용어가 나왔으니 간단히 정의하고 갈게요.
'순증가함수'란 그래프가 항상 올라가는 형태의 함수로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입니다.
반대로 그래프가 항상 내려가는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다항함수와 같이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일대일대응이라면 그 함수는 순증가함수이거나 순감소함수입니다. 위의 정리는 함수가 순증가함수일 경우
위의 정리의 증명은 다음과 같이 귀류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 함수 즉, 이제 인데 이는 |

집합
①
따라서 이 경우는 방정식
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모든 근의 합은
♥ 이해가 잘 되셨다면 공감과 선플은 포스팅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 이해가 잘 안 되신 부분은 댓글을 통해 질문을 주세요.
♥ 본문의 내용은 추가, 보완될 수 있습니다.

'고1 수학의 남다른 개념 > 함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리함수 y=k/x의 그래프에 대한 자세한 이해 (고1수학 함수) (0) | 2022.11.01 |
|---|---|
| 유리식 및 유리함수에 대한 자세한 이해 (고1수학 함수) (2) | 2022.10.25 |
| 역함수의 기본 성질에 대한 자세한 이해 (고1수학 함수 - 개념) (3) | 2022.10.14 |
| 역함수의 뜻 및 원리에 대한 자세한 이해 (고1수학 함수 - 기본 개념) (7) | 2022.10.09 |
|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에 대한 자세한 원리, 요령 및 방법 (고1수학 합성 함수 심화) (0) | 2022.10.05 |





댓글 영역